위기인가 기회인가…美 관세가 바꾸는 韓 제약의 미래

미국이 자국 제조업 보호와 공급망 재편을 명분으로 의약품에 고율 관세 부과를 검토하면서 글로벌 제약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와 제약업계는 미국의 의약품 관세 정책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 검토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무역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의약품도 관세 정책의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관세는 국가가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수입 물품의 가격을 높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거나, 국가 재정을 충당하는 역할을 한다. 제약산업에서 관세는 의약품 가격과 공급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의약품은 그동안 인도적·보건적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낮은 관세율 또는 무관세로 거래되었지만 미국이 자국 제조업 보호와 공급망 안정화라는 명분으로 일부 의약품 품목에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수출입 비용 문제를 넘어, 의약품 공급 안정성·가격·환자 접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원료의약품(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 API) 상당 부분을 해외, 특히 미국과 중국에서 수입하는 국가에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지난 7월 31일,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상호관세를 종전 25%에서 15%까지 낮추기로 합의하며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직 우리나라 의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세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은 최근 EU산 의약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 예고했던 200%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이전의 무관세 원칙이 뒤집힌 변화다. 더 나아가 보호주의 강화 조치로, 최대 150%에서 250%까지 관세 인상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기반으로 의약품 관세가 본격 시행될 경우 2025~2026년에는 최대 15%, 2027년에는 150%, 2028년에는 250%까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의약품 수입·수출 현황은 어떨까? 완제 의약품 수출 규모를 살펴보면, 한국은 2024년 기준 의약품 제조액 약 32.9조원을 기록했고, 수출도 2023년 대비 28% 증가한 12.7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수출 규모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 의약품 수입에서 약 1.6%의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관세 정책의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도 있다. 의약품에 품목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한국은 한미 FTA를 통해 특별 세율 적용이 가능해, 협상에 따라 실질적으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4월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조사에 착수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량 제한이나 고율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조사 대상에는 제네릭과 비제네릭 완제의약품, 공중보건 위기 시 의료 대응에 필요한 품목, 원료의약품, 주요 출발물질 및 관련 파생상품 등이 포함됐다. 미 상무부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미국 내 의약품 및 원료 수요 현황과 전망 ▲국내 생산 역량 ▲해외 공급망의 역할 ▲외국의 보조금 정책과 무역 관행이 미국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우리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으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관세에 대한 반응과 수입비용 완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제약 산업의 성장, 자립의 추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 관세에 반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 무역 협의체에서 보건·의약품 무관세 원칙을 재확인하고 관세 인하를 요구 ▲미국 의존도가 높은 특정 의약품 원료의 공급망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하는 공급망 다변화 전략 등을 취할 수 있다. 한편, 글로벌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제약업계에서 우리나라 산업의 성장을 위한 장기적인 방법으로 ▲제약바이오 연구개발(R&D) 투자 지원 및 규제 개선을 통해 고부가가치 의약품 연구/개발을 확대 ▲국제 품질·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에는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활용해, 현지 R&D 투자와 생산거점 설립을 고려할 수도 있고, 바이오시밀러 분야로의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을 검토해 볼만 하다.
국내 제약업계에서는 미국의 의약품 관세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분위기다. 협상을 통해 한국이 다른 나라와 동등하거나 더 낮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게 된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실제 세율에 따라서는 현지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부정적인 상황 또한 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위탁개발생산(CDMO), 바이오시밀러, 신약개발 기업들은 미국이 한국산 대해 타국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점에 안도하면서도, 아직 세부 합의가 남아있어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먼저, CDMO 산업은 고객사와의 계약을 통해 일정 마진이 보장되기 때문에 당장은 관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관세 부과로 고객사의 수익성이 줄어들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위탁생산 기업으로 일감이 옮겨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바이오시밀러나 제네릭 의약품 부문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만큼 이번에도 관세가 면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반응은 어떨까? 업계 주요 회사들은 다양한 형태로 미국내 생산을 적극 고려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존 국내 바이오시밀러 산업의 강자였던 셀트리온은 최근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리스크를 완전 해소하기 위해 미 현지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을 인수하기로 했다. 미국에 신규 공장을 짓는 것보다는 기존 공장을 인수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전통적 개념의 신약개발 회사들의 경우도 유사한 결의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뇌전증 신약인 ‘세노바메이트(상품명: 엑스코프리)’를 개발해 미국에서 판매 중인 SK바이오팜은 현재 캐나다에서 생산하고 패키징을 완료한 후 미국으로 수출해왔지만 관세가 본격 시행되면 미국에서 생산할 방침이다. 관세에 대비해 약 1년치의 재고도 확보해 둔 상태다. 또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도 CMO(위탁생산) 제조시설을 마련해 의약품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GC녹십자는 혈액제제 알리글로가 필수의약품으로 분류돼 관세 부과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유한양행은 존슨앤드존슨이 렉라자를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어 관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웅제약은 지난 7월 미국 현지 생산시설을 보유한 기업 인수를 위한 독점 교섭 확약(MOU) 을 체결하며 바이오시밀러 본격 진출을 선언했다. 바이든 행정부부터 트럼프 행정부까지 이어져 온 바이오시밀러 확대 공약과 일치하는 기업 포트폴리오의 수정으로, 중장기적인 성장 방안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관세 부과 시 단기적으로는 가격 경쟁력 약화, 생산원가 상승, 공급망 혼란이 우려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의약품 관세 부과가 현지에 진출 또는 진출 예정인 국내 기업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의약품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제제기술과 제조역량을 갖춘 국내 기업들이 좋은 선택지이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미국과 유럽에서 상당한 비중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 경쟁력도 확보한 상태이므로 미국이 중국 견제 기조에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는 이번 관세 부과 협상을 한국 기업과 의약품에 대한 신뢰도와 품질,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미국 시장 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결국 미국의 의약품 관세 부과 논의는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글로벌 제약산업의 경쟁 구도와 공급망 재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한국 제약업계가 이 변화를 위기이자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실무적 대응과 재고·생산 계획 조정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생산 거점 확보,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고부가가치 제품군 강화 등 전략적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 특히 한미 FTA와 국제 무역 규범을 적극 활용해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미국의 공급망 다변화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생산·품질 체계를 갖춘다면, 이번 관세 정책 변화는 오히려 한국 제약산업의 글로벌 입지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Crisis or Opportunity? How U.S. Tariffs Could Reshape the Future of Korea’s Pharmaceutical Industry

The global pharmaceutical market is in flux as the United States considers imposing high tariffs on certain medicines under the banner of protecting domestic manufacturing and restructuring supply chains. In response, the Korean government and pharmaceutical industry are exploring countermeasures to mitigate potential impacts.
In the ongoing reconfiguration of the global trade order, pharmaceuticals have now entered the conversation around tariff policy. A tariff is a tax imposed on imported goods, typically to raise prices and protect domestic industries or generate government revenue. In pharmaceuticals, tariffs can directly influence drug prices and supply stability. While most countries have traditionally maintained low or zero tariffs on medicines for humanitarian and public health reasons, the U.S. is now weighing duties on select pharmaceutical products as part of its push for domestic industry protection and supply chain security.
This shift could have far-reaching implications beyond import and export costs—affecting drug supply stability, pricing, and patient access. For Korea, which imports a substantial portion of its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APIs) from abroad, particularly the U.S. and China, the move could prove a major variable.
On July 31,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had reached an agreement with the U.S. to reduce mutual tariffs from 25% to 15%, ensuring treatment no worse than that given to other nations. While specific rates for Korean pharmaceuticals have yet to be disclosed, the U.S. recently decided to impose a 15% tariff on EU-made drugs—lower than the 200% initially floated by President Donald Trump but still a significant departure from the longstanding zero-tariff principle. The U.S. has also hinted at potential hikes to 150% or even 250% in the name of strengthening protectionist measures. According to the KoreaBIO Bioeconomy Research Center, based on President Trump’s statements, pharmaceutical tariffs could start at up to 15% in 2025–2026, then rise to 150% in 2027 and 250% in 2028. Korea’s finished drug exports reached an all-time high in 2024, with domestic pharmaceutical production valued at approximately KRW 32.9 trillion and exports up 28% from the previous year to KRW 12.7 trillion. However, Korea accounts for only about 1.6% of U.S. pharmaceutical imports, leading some to believe it is unlikely to be a primary target of the new tariffs. Furthermore, under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FTA), certain products could qualify for special rates or even retain de facto duty-free status depending on negotiations.
In April,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launched a national security investigation under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focusing on imports of semiconductors and pharmaceuticals. Section 232 authorizes measures such as import restrictions or high tariffs if imports are deemed to threaten U.S. national security.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 includes both generic and non-generic finished medicines, public health emergency supplies, APIs, key starting materials, and related derivatives. Stakeholders were asked to provide input on U.S. pharmaceutical demand forecasts, domestic production capacity, the role of foreign supply chains, and the effects of foreign subsidies and trade practices on the U.S. industry.
From Korea’s perspective, a two-pronged strategy could be considered:
Short-term — minimize tariff impact and reduce import costs by reaffirming the principle of tariff-free trade for health-related goods under the FTA and WTO frameworks, and by diversifying supply chains to reduce reliance on U.S. sources for critical APIs.
Long-term — strengthen domestic industry self-reliance and growth by supporting high-value-added drug R&D through investment and regulatory reform, bolstering competitiveness to meet international quality standards, and expanding overseas manufacturing capabilities, including U.S.-based production sites. Portfolio diversification into areas like biosimilars could also help buffer risks.
Within the Korean industry, the U.S. tariff plan is generating both anticipation and concern. The prospect of equal or lower tariffs than other countries is encouraging, but any increase in duties could erode price competitiveness in the American market.
For 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s (CDMOs), short-term effects may be limited as contracts often guarantee margins. However, reduced profitability for clients could eventually shift business toward U.S.-based contractors. In biosimilars and generics, the expectation is that tariffs will remain exempt as they were during Trump’s first term.
Major Korean pharmaceutical companies are actively weighing U.S. manufacturing options. Biosimilar leader Celltrion recently decided to acquire an existing U.S. biopharmaceutical plant to eliminate tariff risks—an option deemed more cost-effective than building new. SK Biopharm, which sells its epilepsy drug cenobamate (Xcopri) in the U.S., plans to move production from Canada to the U.S. if tariffs take effect, having already secured about a year’s worth of inventory. It is also preparing manufacturing capacity in Puerto Rico. GC Biopharma anticipates minimal impact on its blood therapy Alglucerase, classed as an essential medicine. Yuhan Corporation sees little effect since Johnson & Johnson already produces its lung cancer treatment Lazertinib locally. Daewoong Pharmaceutical signed an exclusive MOU in July to acquire a U.S.-based manufacturer, marking a significant push into biosimilars in alignment with longstanding U.S. policy goals to expand access to such medicines.
In the short run, tariffs could weaken price competitiveness, raise production costs, and disrupt supply chains. In the long run, however, they may open opportunities for Korean companies with U.S. manufacturing footprints or plans to establish them. For the U.S., which is looking to fortify its drug supply chain, Korean firms with proven formulation technology and manufacturing capacity could be attractive, trustworthy partners. Given biosimilars’ strong market share in the U.S. and Europe, and their established competitiveness, Washington may factor this into its China-containment strategy.
Ultimately, the U.S. pharmaceutical tariff debate extends far beyond a simple trade dispute—it is a matter that will reshape competition and supply chains in the global pharmaceutical industry. For Korea’s pharmaceutical sector, this is both a challenge and a potential springboard. In the near term, companies must focus on minimizing tariff burdens through tactical measures like inventory management and production adjustments. Over the long term, strategic investments in U.S.-based production, global partnerships, and high-value product portfolios—paired with proactive use of the Korea-U.S. FTA and international trade norms—could turn this policy shift into a catalyst for elevating Korea’s position in the global pharmaceutical arena.
<출처>
강민성, 「 美 의약품 관세·약값 정책 불확실성 여전… 떨고 있는 韓 제약·바이오 」 , 『 디지털타임 』 , 2025. 08. 04, <https://www.dt.co.kr/article/12008995>.
이지원, 「 “의약품에 최대 200% 관세?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촉각 "완화 여지 있다" 」 , 『 메디게이트뉴스 』 , 25.07.10, <https://medigatenews.com/news/1521667282>.
전종보, 「 “美, 의약품 관세 불리하지 않게 대우”… 韓 제약사에 미칠 영향은?” 」 , 『 헬스조선 』 , 2025. 07. 31, <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25073102207>.
전종보, 「 트럼프 또 ‘의약품 관세’ 예고했지만… “韓 영향 제한적” 전망 」 , 『 헬스조선 』 ,2025. 06. 21, <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25062002460>.
조희연, 「 “트럼프발 의약품 관세 예고에 빅파마 '들썩' … K바이오도 美 생산 고심 」 , 『 뉴데일리 경제 』 , 2025. 08. 11,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5/08/11/2025081100172.html>.
Liz Hollis, 「 South Korea hits record $23B pharma production in 2024, exports up 28% 」 , 『 BioWorld 』 , 2025. 02. 12, https://www.bioworld.com/articles/722712-south-korea-hits-record-23b-pharma-production-2024-exports-up-28.
Julia Kollewe, 「 Trump's 15% tariff on medicines will harm patients, say EU drugmakers 」 , 『 The Guardian 』 , 2025. 07. 29,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25/jul/29/european-pharmaceutical-firms-criticise-trump-tariffs-on-medicines-as-blunt-instrument.
KCRA Staff, 「 Trump pharmaceutical tariffs could reach 250% in future 」 , 『 KCRA 』 , 2025. 08. 05, https://www.kcra.com/article/trump-pharmaceutical-tariffs-could-reach-250-in-future/65607038.
Samantha Maiden, 「 Labor looks to speed up PBS listings amid calls from lobby groups 」 , 『 News.com.au 』 , 2025. 08. 01, https://www.news.com.au/lifestyle/health/health-problems/labor-looks-to-speed-up-pbs-listings-amid-calls-from-lobby-groups/news-story/55d6d81178d20c66b7d40041494e402e.
Sidhartha, 「 Donald Trump’s fresh tariff warning: 50% on copper, 200% on pharmaceuticals – will it impact India? 」 , 『 Times of India 』 , 2025. 07. 09,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business/india-business/donald-trumps-fresh-tariff-warning-50-on-copper-200-on-pharmaceuticals-will-it-impact-india/articleshow/122342388.cms.
U.S. Department of Commerce, 「 South Korea – Specialty Chemicals 」 , 『 Trade.gov 』 , 2024. 12. 15, https://www.trade.gov/country-commercial-guides/south-korea-specialty-chemicals.
Wikipedia contributors, 「 Manufacturing in South Korea 」 , 『 Wikipedia 』 , 2025. 08. 10, https://en.wikipedia.org/wiki/Manufacturing_in_South_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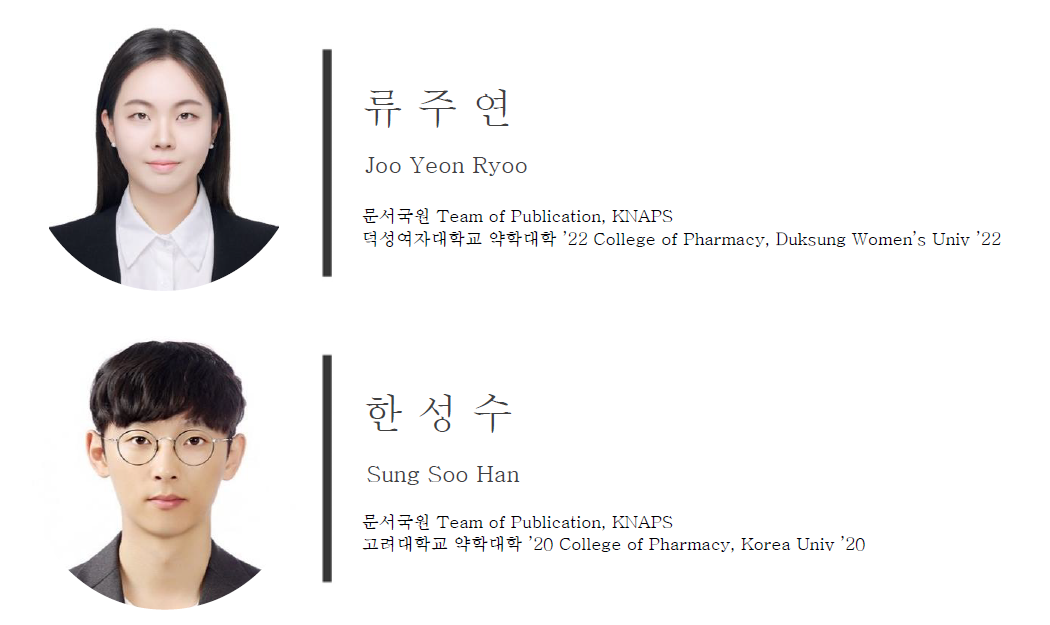

'포스트 > 약업계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AI, 신약개발의 시간표를 다시 쓰다...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까지, 가속 페달 밟는 글로벌 제약업계 (0) | 2025.09.15 |
|---|---|
| K-약국, 외국인 관광객의 ‘코스메슈티컬 쇼핑 성지’로 부상 (0) | 2025.08.20 |
| 약, 이제는 ‘어떻게 먹느냐’의 시대 (3) | 2025.07.25 |
| FDA, 동물실험 단계적 폐지 공식화…제약업계 ‘오가노이드’ 기술 주목 (3) | 2025.07.25 |
| 치료제의 경계, 위고비 청소년 허가를 다시 묻다 (0) | 2025.06.23 |